
국내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 하는 곳입니다.
글 수 38

미술 동·서양 경계를 넘다 - 화가 이우환
| 이우환과 작업실 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의 대학노트를 펼쳐 보여 주었다.캔버스에 점 하나를 그릴 때도 그는 대학노트에 사각형을 그린뒤 그 사각형 속에 점찍을 위치를 미리 표시해 본다. 수없이 해온 작업이지만 망칠 때도, 문득 그리기가 막막해서 동네를 한바퀴 산책하고 돌아올 때도 많다고 한다. [파리=권근영 기자] | |
이우환, 최근 몇 년간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작가 중 하나다. 지난해 한국 미술 경매에서 낙찰 총액 기준, 작품이 가장 많이 팔린 작가다. 40여 년간 자기와 싸우면서 현대미술사에 독자적 영역을 확립해왔다. 백남준 사망 후 한국에서 세계에 내세울만한 몇 안 되는 미술가중 하나다. 그럼에도 그는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블루칩 작가’ ‘경매 시장의 척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본인도 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오죽하면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만난 한국 기자들에게 “내 그림을 경매에서 내려달라”고까지 했을까. 이우환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볼 때가 됐다. 파리 작업실을 찾아가 그를 만난 이유다.
물랑루즈가 있는 파리 몽마르트르의 클리시 거리. 6월의 지는 햇살을 등지고 자그마한 체구의 동양인 노인이 다가왔다. ‘살아있는 미술사’로 불릴 만큼 세계 미술계에 뚜렷한 궤적을 남긴 이우환이다. 프랑스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들뜬 발길을 옮기는 이곳에서 그는 이방인이다. 아니, 그는 평생 이방인이었다.
1936년 경남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동양화과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 만에 그만두고 56년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일본서 시작, 세계를 강타한 ‘모노하’(物派: 사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춤)운동의 핵심이론을 확립한 미술평론가이자 작가로 이름을 알렸고, 7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 전시를 열었다. 현재 파리와 도쿄를 오가며 활동을 하고 있다. 1년의 절반 이상은 유럽에서 지낸다.
노인은 나직하게, 천천히 말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내가 설 땅은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흐른 거고, 그러다 보니 내가 사는 방법이 된 거다”라고. 대가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일본서는 ‘역시 저 사람의 뿌리는 한국’이라고, 한국서는 ‘일본물이 들었다’고 배제했다. 유럽으로 건너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자 ‘동양적’이라며 소외시켰다. 경계를 넘나들다 보니 어이없게도 넘나드는 것 자체가 삶이요, 표현이요, 존재방식이 됐다.”
그는 후미진 골목으로 기자를 이끌었다. 유흥가의 흥청거림과 딴판인 이 골목 안에 자리잡은 3층 건물은 지난 세기 초 입체파로 현대미술을 이끈 피카소·브라크가 작업실로 쓰던 공간이라 했다. 열쇠로 철문을 열자 바로 500호(333.3×218.2㎝) 캔버스가 깔리면 꽉 차는 작은 방이 나왔다. 여기 틀어박혀 그는 점을 찍고, 선을 긋고 있다. 이우환, 照應(조응) / Oil on Canvas / 73×60 / 1999 이우환, 照應(조응) / Oil on canvas /130x161 / 1994 LEE, U FAN 이우환 1998 시카고인터내셔날아트전(시카고, 미국)/ 1991 한국현대미술의 한국성모색 III(부전 한원갤러리)/ 1992 파리 갤러리파리, 개인전(공간화랑, 부산)/ 1993 일본 가마쿠라근대미술관, 예술의 정신 (히로시마 후꾸야마미술관, 일본)/ 1994 개인전 국립현대미술관, 일본 현대미술(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1995 한국 현대미술북경전(중국미술관, 북경, 중국), 전후 일본미술의 전개(메구로구미술관, 동경, 일본)/ 1996 개인전 일본 동경화랑, 메이드인 프랑스(퐁피두미술관, 파리, 프랑스)/ 1997 개인전 갤러리현대, 박영덕화랑/ 1998 '98한국 현대미술전-시간(호암갤러리)/ 1999 파리 갤러리뒤랑데쎄르, 한국미술 50년:1950-1999(갤러리현대)/ 2001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1960-1970(갤러리현대)
문간엔 그가 캔버스에 점 하나를 찍을 때 쓰는 폭 20㎝ 가량의 붓 한 묶음이, 벽에는 97년 한국인 최초로 파리 쥐드폼 미술관서 개인전을 열 때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뒷면으로 돌려진 채 벽에 세워둔 여러 개의 완성된 캔버스. 그걸로 끝이다. 선방 같은 작업실에선 은둔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가 연주하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흘러 나왔다.
그는 먼저 그간 한국 언론을 피하고, 한국 미술계에 불만을 표시해온 이유에 대해 운을 뗐다.
“오늘날 미술이란 어떻게 성립되는가. 비엔날레 같은 국제전을 위시한 전람회, 아트페어나 경매 같은 그림 장사. 이들을 떠나 미술이 성립할 수 없음은 부정할 수 없는 요소다.” 차를 따르며 그는 “다만”하고 말에 힘을 실었다. “예술가는 어디 서 있는가. 미술계의 성립과 별개로 예술가의 사회적·역사적 책임, 자기 일에 대한 태도 등을 물으면 어떻게 답할 건가. 예술가에겐 그게 중요하다. 작가나 작품에 관심 없는 돈놀이일 뿐인 경매에 소개되지 않아도 좋다. 다 외면했으면 좋겠다.”
꼬장꼬장한 그에게 예술은 뭘까. “예술은 예술을 하는 거다. 예술이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나 역시 예술을 통해 정치·사회·역사적 발언도 한다.”
마냥 순수하고 깨끗하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은 그의 작품도? “예컨대 철판 위에 돌을 얹은 내 조각은 산업사회의 출발인 철판과 자연에서 주워온 돌을 관계 지었다. 내 회화도 그렇다. 나는 테크놀로지보다는 훈련된 신체에서 리얼리티를 찾고 싶다. 신체는 우리의 내부와 외부를 매개한다. 신체를 외면하는 정치, 물질 위주의 사회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문득 궁금해졌다. 미술사에 어떤 예술가로 남고 싶은지. 이날도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두 건 했다는 그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라며 생각에 잠겼다. 고심 끝에 나온 대답은 이렇다.
“근대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 작가로 남고 싶다. 근대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최소한의 회화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을 내놓은 작가 말이다. 화가는 시대의 지식인이어야 하고, 그 시대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쟁이’다.”
그는 외국 출장 중엔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며 기자를 한식당으로 이끌었다. 노인은 저녁 식사를 마치자 다시 작업실 철문을 닫아걸었다. 그가 혼자 힘으로 세계적 화가로 일어설 동안 우리는 그를 배제했고, 유명해지자 “한국이 낳은 세계적 거장”이라며 칭송했다. 요즘은 특히 그의 그림이 돈을 벌어 준다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화폭과 대면한 채 자신과 치열하게 싸울 뿐이다.
초여름의 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다. 유흥가는 대낮보다 밝았지만, 이우환의 작업실 주변은 절간처럼 괴괴했다.
파리=권근영 기자
이우환은 …
“처음 거실에 선생의 그림을 걸어두고는 그 깨끗한 아름다움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편하고 불안해졌어요. 왜일까요.”
한 컬렉터가 이우환에게 물어왔다. 그 사람, 제대로 본 모양이다. 이우환은 “예술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며 “내가 찍은 점은 늘 한가운데가 아니라 비켜서 있고, 둘 이상의 점은 대칭되지 않고 조금씩 어긋나 있다. 그 긴장감으로 바깥과 밀고 당기는 힘이 생긴다. 이를 통해 바깥 세상과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그림 속 점만 서로 불화하는 게 아니다. 이우환도 세상과 불화한 채 이리저리 떠돌았다. “거리의 역학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유년기에 시·서·화 등 유교식 교육을 받았다. 일본에선 철학을 전공했다. 67년 도쿄 사토 화랑 개인전 이후 전위적 예술표현을 추구했다. 68년 무렵 ‘모노하’ 운동의 중심에 섰다.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겠다는 야심보다 사물이 상황에서 갖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예술운동이다.
유럽 활동은 70년대 초 시작했다. 파리 국립 쥬드 폼 미술관, 본 시립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쥬드 폼 미술관에선 97년 한국인 첫 개인전을, 2004년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다. 국내에선 2003년 로댕갤러리·호암갤러리서 연 회고전 이후 활동을 접다시피 했다. 파리 에콜 드 보자르 초빙교수, 도쿄 다마미술대학 교수도 지냈다.
철판 위에 바윗돌을 얹은 ‘관계항’이 60년대 후반의 초기작이다. 이어 캔버스에 점을 찍거나 직선을 긋는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연작에 집중했다. 80년대에는 자유로운 붓질로 이리저리 선을 그은 ‘바람으로부터’, 90년대에는 캔버스에 점을 하나 둘 찍어 최소한의 행위로 긴장감을 보여주는 ‘조응’ 연작을 내놓았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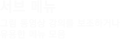





제가 자라서 만난 소위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도 다른 학문을 하거나 편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 분의 인터뷰를 읽으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