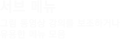기획의 참신성, 규모, 구상미술 여부등 고려하여 추천
글 수 183
누가 사는 집?
2013_1115 ▶ 2014_0112
초대일시 / 2013_1121_목요일_05:00pm
참여작가 / 김을_노순택_민성식_진훈_Garhard Gross
관람시간 / 10:30am~06:30pm
갤러리 화이트블럭Gallery White Block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2Tel. +82.31.992.4400www.whiteblock.org
인간을 둘러싼 공간들 가운데,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키는 공간은 다름 아닌 '집'이다. 따라서 집은 생존을 위해 거주한다는 실제적인 의미 이외에 안전함, 익숙함, 포근함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나치게 익숙한 공간인 만큼, 미술의 역사상 집이 미술작품의 소재가 되었던 일은 별로 없었다. 소시민의 삶을 대상으로 했던 독일 비더마이어(Biedermeier) 회화에서 집 안의 풍경을 깨끗하고 안락하게 그렸던 풍속이나, 거리를 그린 풍경화의 일부로 집이 그려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집이라는 것은 그다지 주목할 필요도 색다를 것도 없는 소재일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집이 가지는 전형적인 의미를 의심하는 미술가들이 눈에 띄고 있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 집은 더 이상 아늑하게 주인을 맞는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꿈 속의 그것이거나, 지나온 삶과 살아갈 삶의 회한과 곡절을 담은 공간이거나, 친숙한 듯 보이지만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타인의 공간이거나, 내 것이었다가 빼앗긴 공간이다.

- 김을_무제_혼합재료_24×30×24cm_2011
김을이 그리고 만들어내는 집의 이미지는 많은 경우 자신의 작업 공간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는 일이건 만드는 일이건 작가의 삶의 흔적이 배어나는 '드로잉'으로 여기는 김을의 집-오브제, 집-그림에는 작가의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이 녹아 있다. 화재로 불타버린 과거의 작업실을 미니어쳐로 만들어낸 작품은 잊혀지지 않는 과거를 현재에 불러 그 의미를 반추하는 작업이며, 산꼭대기에 올려놓은 가상의 집 연작은 집/작업실로 향해 도달하기 위한 고난의 여정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

- 민성식_목수의 집_캔버스에 유채_65×91cm_2013
반면 민성식이 그리는 공간은 일상적인 집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을 상상 속의 집이다. 현대의 도시인들이 희망하지만 결코 쉽게 가질 수 없는 생활 방식이 드러나는 그의 공간에는, 종종 그 비현실성을 증명하는 기물들이 함께 그려져 있다. 다다를 수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에 대한 염원,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희망과 절망이 작품 속에서 교차한다.

- 진훈_Humane Block/no.1_캔버스에 아크릴채색_72.7×90.9cm_2013
진훈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집이 있는 풍경들은 실제 현실의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 모습이지만, 결코 그림의 대상이 될 법하지 않은, 오히려 살풍경에 가까운 대상들로, 민성식이 그리는 집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그가 그려내는 집의 외관은 답답하게 차단된 듯한 느낌을 자아내며, 아파트의 조밀한 창문들이 반복되는 삼면화(Triptych), 건물의 옆면에 붙어있는 계단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반복한 이면화(Diptych)는, 현대인이 처한 몰개성의 상황을 강조한다.

- Gerhard Gross_Freeze Frames_C 프린트_2006~7
타인의 집 창문을 멀리서 촬영한 게하르트 그로스(Gerhard Gross)의 사진은, 같은 집의 창문을 시간 차이를 두고 찍어 이를 동일한 프레임으로 제작하여 연속 설치한 작품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안의 기물이나 인물이 움직이는 장면들이 포착되어 동일한 창문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볼 수 있다. 타인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는 일은 도덕적으로 금지된 일이기에, 커튼이 열린 창 너머의 실내는 단절의 공간이면서 유혹의 공간이다.

- 노순택_남일당디자인올림픽# III-19_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_90×65cm_2009
노순택의 「남일당 디자인 올림픽」 연작에서 보여지는 집들은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의해 강제 철거된 집들의 면면이다. 어두운 실루엣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견 미니멀한 흑백 사진처럼 보이지만 세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칠게 공격을 받은 듯한 집의 부분들이 발톱을 세운 괴물과도 같이 실체를 드러낸다. 한때 누군가의 포근한 잠자리이자 생활 공간이었던 장소가 낯설고 공포스러운 외부의 공간과 폭력적으로 만나 이루어진 찢어진 듯한 외곽선과 흑백의 면대비는 시대의 아픔을 느끼게 한다. ● 이들의 작품 속에서 집은, 돌아가 쉴 수 있는 안락한 가정과 동일한 의미의 집이 아니다. 이들의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는 힘겹게 도달해야 하는 집, 보기만 해도 숨 막히는 집, 세상에는 없는 집, 남의 집, 혹은 빼앗긴 집은, 쉽게 정처를 둘 수 없는 오늘의 삶에 대한 상징인 것이다. ■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