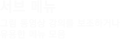국내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 하는 곳입니다.
글 수 38

![]()
캔버스 안에 웅크려 앉아있는 어느 화가
개인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을 선호한다. 작품의 어느 부분이 나의 시각적 혹은 감성적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동력은 바로 그러한 ‘여지’라 할 수 있다. 스펙터클을 지향하는 요즘 작품들 틈에서 이우림의 작품이 필자에게 지니는 의미는 바로 그 지점에 존재한다.
애당초 회화는 화가의 자기고백적인 성격이 강한 법이며, 특히 구상회화의 가장 큰 매력은 관람객들이 개별 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과거나 현재, 혹은 사고의 흔적까지도 구체적으로 발견해내고, 그 흔적들을 근거 삼아 실체적인 이야기로 구성, 혹은 재구성할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일종의 퍼즐맞추기인 셈인데, 작가와 관객 사이에 존재할수 있는 이러한 은밀한 소통의 놀이를 기꺼이 즐기는 편이다.
쓸데없이 서두가 길어졌다. 이우림의 작품을 들여다보자. 숲 속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150호 크기의 캔버스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백한 계단 앞에도 어김없이 남자는 등장한다. 때때로 이 남자는 그 정체를 알수 없는 숲 속에 덩그러니 놓인 ‘축음기’로, 때로는 반복적이고 관성적인 지리한 일상에 녹아내린 지방덩어리의 쇼파로 물화되어 등장하기도 한다. 이우림의 작업에서 매력은 바로 이 ‘인물’과 ‘공간’으로 압축된다. 언제, 어떤 식으로 등장하던 간에 무언가를 뒤집어 쓴 채 등장하는 이 남자에게 있어 모호한 배경 속에서도 선명히 도드라지는 이 천자락이 일종의 방어기제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이렇게 제멋대로 제단하며 해석하기에 이르는 또 다른 힌트는 연작 시리즈로서 ‘몽(夢)’ 이라고 붙여진 제목에서인데, 나는 이 연작들에게 ‘꿈’이라기보다는 ‘백일몽’이라고 이름 붙이는 편을 택한다. 왜냐하면 사람 좋고 심히 내성적인 이우림이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질식시키지 않기 위해 취할수 있는 일이라곤 백일몽만큼 그럴 듯 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꿈꾼다. 남루한 예술가의 일상이 그림 속에서처럼 꿈속같이 나른하고 안락할수 있기를….
한 남자로 대변되는 그의 형상이 단순히 1차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는 것은 한정된 캔버스 너머로 존재하는 무한한 공간의 가능성 때문이다. 남자의 등 뒤로 빼꼼이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나는 캔버스 너머의 공간으로까지 말도 안되는 나의 내밀한 상상력을 뭉게뭉게 피워나간다. 공간적 확장이라는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인식의 경험까지도 확대시키고 이러한 류의 ‘여지’에 나는 금새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일찌감치 고충환 선생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풍경은 자연인가?’ 그리고 답하기를, ‘자연을 자기의 내면으로 불러들여 재차 뱉어낸 것이 풍경’이라고 했다. 그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공간’은 이러한 내면의 풍경을 모태로 하기에, 그 존재감이 더욱더 빛을 발한다. 그렇기에 이 공간은 현실의 것이라기보다는, 현실과 현실이 아닌 곳 사이의 모호한 곳에 존재한다. 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해석의 ‘여지’는 이 ‘모호함’으로부터 비롯된다. 평론가 남인숙은 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해내는 것이 앞으로 작가의 숙제라고 말했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다만 그 공간이 뜬금 없는 공상적 환타지로 튀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실상 이우림의 작품을 한 부분씩 떼어 이해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의 작업에서 딱히 언급할만한 기술적 테크닉이 존재하는 것도, 거대한 담론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뭐 구상회화의 영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만서도 말이다. ‘왜 회화냐? 그래서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건가?’ 같은 질문을 그에게 던져봤자 별 뾰족한 대답은 기대않는 편이 낫다(실제로 해봤는데, 그냥 웃기만 했다). 이우림과 같은 인간들은, 그냥 고집스레 자신의 길을 간다. 여기에는 ‘왜 이것이여야만 하느냐? 는 식의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린다는 행위는 그가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이고, 그는 다만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축적해나가는 지가 명명백백 드러나는 내화된 풍경 속에서 좀더 치열한 밀도와 방향성을 채워나가는 것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의〈삶의 풍경〉(Life Landscape, 2004)전을 통해 전국구(?)로 막 데뷔한 그에게 ‘전구구 지면’을 통해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지만, 수년간 그가 집착하고 있는 ‘몽’의 풍경이 무의미한 자기 복제의 형태로 느슨해지기 전에 짚어보았다.
고작 이 정도까지가 이우림에 대해 내가 맞춘 퍼즐의 정도다. 이제 막 시작한 퍼즐맞추기가 앞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응답에 상응하는 형태를 띄우기까지 아마도 기나긴 인내심이 필요할 터인데, 뭐 기다려 볼 작정이다.
박파랑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