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 하는 곳입니다.
글 수 38

대지 I 1997 캔버스 아크릴릭 91 X 71cm
검은강 I 1997 캔버스 아크릴릭 360 X 160cm
검은강 ll 1997 켄버스 아크릴릭 122 X 74.5cm
대지-꿈 Ill 1999 캔버스 아크릴릭 91 X 71cm
검은강 lll 1997 캔버스 아크릴릭 91 X 72.7cm
봄 l 1997 캔버스 아크릴릭 182 X 91cm
봄 ll 1998 캔버스 아크릴릭 100 X 61cm
봄 lll 1997 캔버스 아크릴릭 91 X 72.7cm
봄 lV 1998 캔버스 아크릴릭 72 X 31.5cm
봄 V 1997 캔버스 아크릴릭 53 X 45.5cm
봄 Vl 2000 캔버스 아크릴릭 98.5 X 61cm
땅과 거인의 숨결
97김재홍은 서울을 떠나 봉일천 근처의 하제마을로 작업실을 옮긴다. 아마도 이 시기는 그의 작업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공릉 주변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의 격동저긍로 치달았던 분노의 감정을 서서히 가라앉히게 된다. 이제는 자연을 화폭에 담게된 것이다. 외부적 자극에 지나치게 휩쓸렸다는 생각에서일까. 아니면 편협적 자의식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본연의 모습을 찾았기 때문일까. 이 둘은 모두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이유만은 아닌 듯 하다. 그가 담아낸 자연 경관속에는 아직도 지난한 역사의 강을 건너온 인간의 삶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와 형식에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을 그의 작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동안 김재홍은 한번쯤 매우 큰 숨을 가슴깊이 들이 쉬었을 듯하다. 그리고 천천히 화폭으로부터 날숨이 뿜어져 나온다. 자연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인의 숨결이....... 98년 갤러리 사비나에서 기획전의 테마는 거인의 잠이다. 삭막한 겨울을 지난 이른 봄 평온해 보이는 들판과 나즈막하게 드러누운 야산에는 파릇한 새순이 돋는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나른한 우리 산하의 일상적 풍경에 다름없다. 그러나 단순히 한가로운 농촌 풍경으로 보기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돈다.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그곳에 누워 침묵하고 있던 거대한 땅의 생명체가 나를 향해 돌아눕는 모습을..... 내가 쳐다보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것이 돌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즈막히 드러누운 야산은 잠자는 거인의 얼굴이며 가슴이고 파해쳐진 개간지는 살점을 뜯기운 거인의 생채기였던 것이다. 무심코 놓은 산불로 거인은 속살을 드러내고 피를 흘린다. 또다시 파해쳐진 내천은 이 땅의 꿈을 싣고서 거인의 모습으로 고여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자연이라는 거인으로 대치되었다. '거인의 잠'으로부터 김재홍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윤리를 문제삼게 된다. 이 땅과 자연은 곧 우리의 삼의 터전이자 우리의 살과 피라는 유기적 사유로 부터 우리가 황폐화시키는 이땅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존재를 상처지우는 행위임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려하는 것이다. 표현의 시작적 측면에 있어서도 종래와는 현격히 다른 변화의 폭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작품에 내재된 작가의 시각적 위치의 변화이다. 종래의 서사적인 역사화에 있어서는 서술자인 작가의 위치가 너무도 완강히 중심에 서서 작품의 구조를 조종하고 있었다면 이제 작가는 화면 뒤편으로 한 발짝 물러나고 자연이라는 대상이 스스로 자신의 시선을 감상자를 향하여 투사되도록 놓아두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의 풍경화는 작가의 일방적 시각에 의해 대상을 화폭에 고정시키는 서양적 시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바라보기만 하였을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작가는 스스로의 상상력에 의하여 자연으로부터 들려오는 응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고 우리에게 그 큰 경고의 목소리를 나즈막히 들려주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관심은 근간에 들어 더욱 구체화되어 간다. 한동안 그는 동강 나들이가 잦아졌다. 환경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동강은 그에게도 관심 밖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김재홍은 경탄스런 자연의 조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인 자신을 보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보잘 것 없는 인간의 그칠줄 모르는 욕망이 자신의 근원인 자연에 얼마만한 흠집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공포감 또한 느꼈을 것이다. 이 땅과 자연은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기술문명이 아니고서는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거대 자본과 첨단 기술문명은 인류를 당분간의 편리함으로 이끌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미래에 대한 책임을 아우르는 생태학적 윤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과거-현재-미래를 관류하는역사의 흐름은 여전히 몸추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 곧 우리의 이땅에 내재된 역사이기도 하다. 김재홍의 동강 풍경에는 이처럼 이땅의 삶의 역사가 잠재되어 숨을 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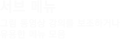





그림 맞아요?????와우